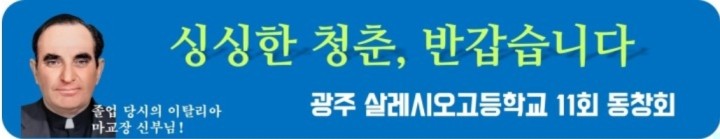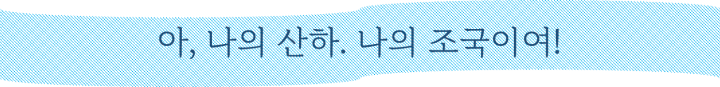- 살레시오고등학교 11회동창회
- 살레시오동문회ㅣ돈보스코 성인
- 2025살레시오고11회 소식
- 2025살레시오11회 일정표
- 2024살레시오동창회 활동
- 살레시오동창회ㅣ김희중 교구장
- 살레시오동창회ㅣ하성래 회상기 3
- 살레시오동창회ㅣ하성래 회고록 3
- 살레시오고11회동창회 집행부
- 살레시오동창회 11회 집행부 7
- 살레시오동창회11회 친구찾기 8
- 살레시오동창회ㅣ휴먼 포유
- 살레시오11회동창회ㅣ유관그룹
- 2023 살레시오동창회 활동 2
- 2022 살레시오동창회 활동
- 2021 살레시오동창회 활동
- 2020 살레시오동창회 활동
- 2019 살레시오동창회 영상
- 2019 살레시오동창회 앨범
- 2019 살레시오동창회 여행
- 2018 살레시오동창회 임기
- 2018살레시오동문골프대회
- 2018 살레시오동창회 앨범 4
- 2018 살레시오동창회 여행 3
- 2018 살레시오동창회 영상 4
- 2017 살레시오동창회 영상 5
2016.5. 벗지 하성래
■ 살레시오고 11회 동문회ㅣ살레시오고 서울동창회ㅣ살레시오고 총동창회
아, 나의 산하. 나의 조국이여!
(2016년 5월 6일)
규운(圭雲) 하성래(河聲來. 아우구스티노) 박사
■ 하성래 선생님(살레시오고 재직기간 1965. 3.10. ~1974. 2. 28)
어머니의 분함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나는 나라 없는 슬픔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며 소년 시절에 굶주린 배를 움켜잡으며 자랐다. 마을 앞에는 길에서 보이지 않도록 낮은 돌담으로 가려진 작은 빨래터가 있었다. 아침에 마을 앞 빨래터에 가면 젊은 아낙네들이 모여 밥을 지을 쌀을 씻고, 더러는 나물을 씻고 빨래를 하기도 하였다. 우리 마을은 반촌이어서 남녀가 일곱 살을 넘으면 한 자리에 앉는 것도 예절에 어긋난다 하여 남녀가 말을 건네는 것도 삼갔다. 길거리에서 만나도 여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가거나 얼굴을 외로 돌리고 지나갔다. 남자들이 빨래터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아침 밥 지을 쌀을 씻기 위해 빨래터에 다녀오신 어머니께서 “천하에 죽일 놈, 개, 돼지만도 못한 놈!” 하시며 온 몸을 부르르 떠시었다. 할머니께서 사연을 묻자 지초지종을 말씀하였다. 쌀을 씻는데 일본인 순사 카키모토가 빨래터 안으로 불쑥 들어와 “천황폐하께 바칠 공출은 안 내면서 왠 쌀밥이야? 조센진들 충성심이 없어!” 하며 쌀바가지를 빼앗아 길바닥에 던져버리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젊은 일본인 순사에게 수모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분하다! 분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의 정적을 깨며 마당으로 흘러나왔다. 나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 하늘의 적벽산과 서쪽 하늘의 무등산을 바라보았다.
“분하다! 분하다!” 어머니의 외마디 소리가 한 맺힌 하늘가에서 울고 있었다. 적벽강 강물도, 무등산 등성이도 안개 같은 한 맺힌 얇은 홑이불을 덮고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내 고향 강물을 보거나 산을 바라보면 하늘 끝에서 어머니의 “분하다! 분하다!” 하는 목소리가 한 맺히게 들려왔었다.
숨어서 본 주재소 안 풍경
일본 순사에게 어떤 수모를 당해도 마을 사람 누구 하나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하였다. 만약 항의를 하면 “불손 센징(鮮人)” 이라 하여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였다. 우리 집은 일본인 순사들이 머무는 주재소와 담장 하나를 두고 나란히 있었다. 나는 담장 너머 주재소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오면 돌담 위로 올라갔다. 거기 올라가면 유리창 너머로 주재소 안이 환히 들여다보였다. 그들은 이른바 ‘불손 선인’을 고문할 때는 두 가지 형구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사람들이 ‘쇠좃매’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50cm쯤 되는 강철 스프링이다. 이른바 ‘불손 선인’을 등근 의자에 앉혀 놓고 이 강철 스프링으로 휘둘러 치면 비명 소리와 함께 옷이 찢어지면서 살점이 떨이지고 피가 흘렀다. 또 한 가지 고문은 전기고문이었다. 수동식 발전기 손잡이를 돌리면 전기가 번쩍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사람이 쓰러졌다. 나는 이 잔인한 고문 광경을 돌담 위에 올라가 숨어서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일본인 순사에 대한 공포와 전율을 느끼면서 형언할 수 없는 분노 같은 것이 가슴 속에서 치밀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치를 떨며 보았던 고문 광경은 우리 고향 독립운동의 선구자 변극(邊極) 선생을 따르던 청년에 대한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주재소 앞 다리께서 다른 한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피 묻은 옷을 걸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분을 뵈었다. 흰 옷에 묻은 혈흔이 역력한데도 무등산과 마을 앞 별산[星山]은 말이 없었다. 침묵하였다. 나는 침묵한 그 산을 붙들고 한 없이 울고 싶었다.
망미정(望美亭)의 시회(詩會)
내가 살던 야사리 마을 앞으로는 무등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시냇물이 있다. 이 물은 적벽강으로 흘러든다. 지금은 동복땜이 건설돼 적벽은 절벽의 반이 수몰되고 광주시민의 수원지로 변했지만, 내가 어릴 때는 물이 맑기가 명경 같았다. 명경지수(明鏡止水)란 이런 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석간수가 차고 달았다. 야사에서 흘러온 물은 창랑에서 흘러온 물과 학당리에서 합류하여 노루목을 굽이돌아 적벽강으로 들어간다. 학
당리 뒷산은 반들거리고 푸르기가, 학이 소나무에서 발을 굴려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하였다.
이 학당리에서 노루목까지는 물줄기가 S자 형으로 굽이돌며 양안의 절벽이 병풍 같다. 이 물줄기가 흘러와 절벽과 맞닿는 곳을 적벽이라 부른다. 길이 300여m, 높이 30여m, 수심 3·4m의 장엄한 병풍을 두른 듯하다.
적벽하면 소동파(蘇東坡)의 장시 「적벽부」가 생각난다. 절벽 밑에 푸른 강물이 출렁이는 이 절경을 보고 1519년(중종14) 기묘사화 때 동복현으로 유배된 신재(新齋) 최산두(崔山斗, 1483-1536)가 적벽이라고 명명하였다. 소동파가 「적벽부」를 읊은 적벽은 가보지 못해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없지만, 내 고향 적벽은 절벽과 산과 물이 신비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신선이 사는 듯한 꿈의 경치를 만들어 낸다.
밤에 배를 타고 옹성산 위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면 배에서 일어나 달을 잡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절벽 밑의 깊고 검푸른 물은 용이라도 숨어 사는 듯 두렵고 무서웠다. 절벽 중간에는 언제 누가 올라가서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적벽동천(赤壁洞天)’이라는 붉고 큰 글씨가 조각돼 있다. “저 절벽을 어떻게 올라가서 글씨를 쓰고 조각을 했을까?” 어린 내게는 그것이 한없이 궁금하였다.
노루목에서 흘러오는 거센 물줄기가 절벽에 부딪히면서 물을 깊게 만들고 강변에 백사장을 만들었다. 바다를 보지 못하고 자란 나는 초등학교 때 이곳으로 소풍을 오면 이곳이 마치 바다인 듯 착각하며 마음이 맑고 시원하기가 하늘에 닿을듯하였다. 배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배 밑으로 보이는 투명한 조약돌과 고기들을 보며 손으로 잡은 듯 기쁜 소릴 질렀다.
팔월 한가위 때는 적벽에서 낙화놀이를 한다. 절벽 꼭대기로 올라간 장정들이 나무에 몸을 묶고 초깔에 불을 댕겨 강물로 던지는 것이다. 그때 불꽃 떨어지는 모습이 낙화암에서 삼천 궁녀가 떨어지는 거와 같이 장관이었다. 불꽃이 떨어지는 때면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함성을 질렀다. 이 놀이를 낙화놀이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낙화놀이가 사라진지 오래 되었다. 강변 백사장에는 망미정(望美亭)이 있다. 망미정이란 이름은 「적벽부」 속에 “망미인혜천일방(望美人兮天一方 = 저 하늘 끝에 있는 미인(임금)을 생각함이여!)” 하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 따다가 지은 듯하다. 여기서는 선비들이 모여 시회를 열고 활을 쏘며 술을 마셨다.
소동파가 「적벽부」를 지은 것이 1082년 임술년이었다. 그러므로 이 고장 선비들은 600년이 지나 1682(숙종8)년 임술년이 돌아오자, 하성구(河聖龜) 반학공(伴鶴公)을 중심으로 망미정에 모여 시회를 열었다. 그 후 또 60년이 지나 1742년(임술, 영조8)에는 하영청(河永淸) 병암공(屛岩公)을 비롯하여 62명이 모여 시회를 열었고, 또 60년이 지나 1802년(임술, 순조2)에는 규남(圭南) 하백원(河百源) 선생을 중심으로 51명이 모여 세 번째 시회를 열었다. 무려 18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이때 읊은 시들을 모아 엮은 책이 『적벽삼유록, 赤壁三遊錄』이다.
나는 『적벽삼유록』의 책장을 넘기면서, 또 그 시들을 읽으면서, 옛 시인들의 풍류와 낭만, 그 시인들이 사랑한 내 고향 산하 적벽과 조국의 산하를 나 역시 무한한 애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조국 광복이 되자 고향을 떠나 광주로 나와 살았고, 지금은 서울로 올라와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고향이 그리웠다. 적벽이 그리웠고, 야사리 마을 앞 시냇물 소리가 그리웠다. 그 물소리 속에는 웬일인지 어머니의 “분하다! 분하다!” 하는 목소리와 주재소에서 지르던 그 청년의 비명소리가 섞여서 들려왔다.
■살레시오고동창회ㅣ살레시오고동문회ㅣ살레시오동창회ㅣ살레시오동문회ㅣ살레시오고교동창회ㅣ살레시오고교동문회ㅣ살레시오고등학교동창회ㅣ살레시오고11회동문회